‘혼잡통행료 법안’ 통과… 내년부터 오클랜드 도입 본격화
- WeeklyKorea
- 2025년 11월 16일
- 2분 분량
교통 혼잡 완화·생산성 향상 기대… 저소득층 부담 논란은 숙제로

국회가 오랜 논의 끝에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3차 독회를 마치고 가결되었으며, 정부는 오클랜드(Auckland)를 시범 도입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혼잡 줄이고, 경제 효율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수년간 논의돼 온 혼잡통행료 제도가 마침내 현실화됐다”며 “도시 생산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또한 “국가 경제의 중심지인 오클랜드가 첫 시범 도시로 적합하다”며 “정부는 오클랜드시와 협력해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인 브라운(Wayne Brown) 오클랜드 시장 역시 “혼잡통행료는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 패턴을 바꿔 도심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정책적 선택”이라며 “돈이나 두려움만이 행동 변화를 이끈다”고 강하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예상 요금은 3.50~5달러… 저소득층·장애인 예외 검토
오클랜드시는 이미 주요 도심 진입도로와 고속도로 주변 구간을 중심으로 통행료 부과 구역을 검토 중이다.
브라운 시장은 1회 통행 시 3.50~5달러 수준의 요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할인·면제 제도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로는 뉴욕(최대 16달러), 런던, 싱가포르, 스톡홀름 등이 있다. 이들 도시에서는 교통 혼잡이 최대 30% 감소, 이동 시간 평균 20~25% 단축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행 시기 — 빠르면 내년 중반 오클랜드에서 시작
법 통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며, 빠르면 2026년 중반 오클랜드에서 첫 시범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행 전에는 법에 따라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진행된다.
혼잡통행료 운영은 NZTA(뉴질랜드 교통청)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하며, 최종 승인 권한은 교통장관에게 있다.
논란과 우려 — “형평성 문제와 대체 교통수단이 관건”
그러나 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비판론자들은 “부유층은 요금을 내고 빠르게 이동하지만, 저소득층은 돌아가거나 출근 시간을 바꿔야 하는 ‘이중 교통체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들에게 “차를 두고 버스를 타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여성·돌봄노동자·장애인 등 이동 제약이 큰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성공 사례 — “초기 반발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 경쟁력 높여”
싱가포르는 이미 1975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해 아시아 도시 중 교통 효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런던과 스톡홀름은 혼잡 감소뿐 아니라 통행료 수입을 통해 대중교통 개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뉴욕시 역시 올해 초 ‘혼잡 완화 구역(Congestion Relief Zone)’을 도입해 이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도심 상권 침체와 시민 부담”을 이유로 제도 철회를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가 전망
뉴질랜드 교통 전문가들은 “혼잡통행료는 교통 수요를 조절하는 경제적 신호제(Economic Signal)로, 장기적으로는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중교통 확충, 사회적 형평성 보완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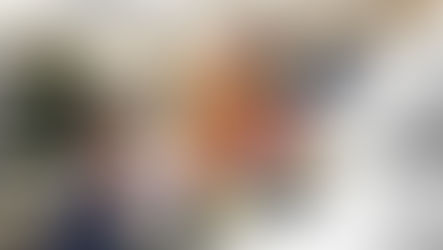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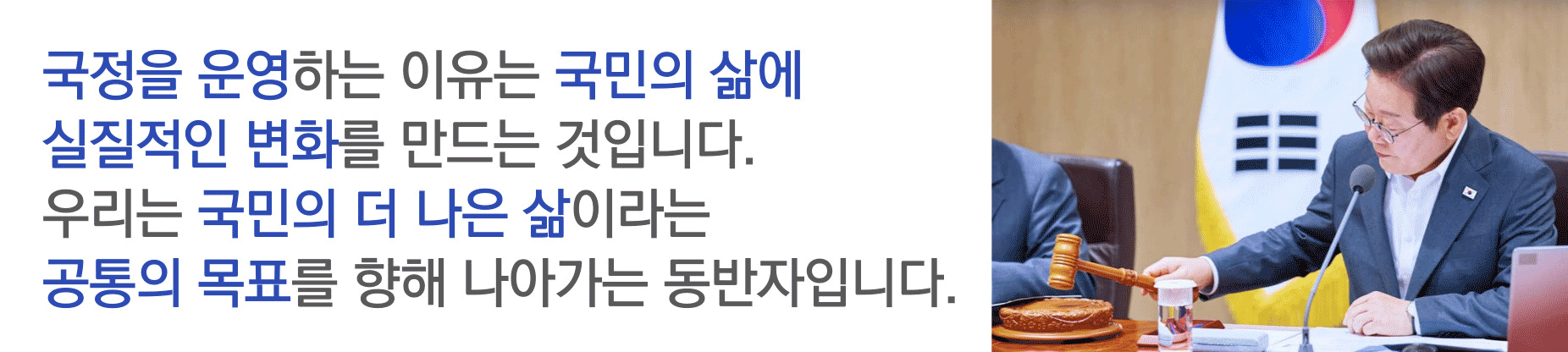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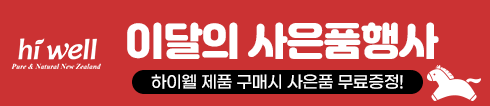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