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귀연 판사의 뒤집힌 말들…신뢰를 잃은 이유
- Weekly Korea EDIT
- 2025년 9월 26일
- 2분 분량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세 번째는 음모다(Once is happenstance. Twice is coincidence. The third time it's enemy action).”
007 소설의 이 문장은 반복되는 설명의 불신을 압축한다.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은 지금, 대법원이 가장 명확히 반대한 사안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였다. 그런데 그 논의의 한가운데에서 지귀연 재판장의 일련의 언행은 법원과 재판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설명은 많았지만, 결론은 불안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때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대미문의 사안이었고, 이후의 절차와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런 상황에서 지 판사는 단지 법리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권•증거 취급 문제, 상급심의 파기 가능성, 재심 사유에 대한 예단까지 상세히 언급했다.
언뜻 합리적 우려로 보였으나, 문제는 그 설명이 ‘1심 재판부의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 상급심•외부의 영향을 지나치게 의식한 흔적으로 읽혔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면서도 반복적으로 “상급심에서 이러이러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공개 • 비공개의 일관성 결여가 낳은 불신
정보사 증인 신문을 둘러싼 처리도 혼란을 키웠다. 일부 재판에서는 보안 이유로 방청객과 취재진을 모두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이후에는 가림막을 설치해 취재진은 법정에 머물 수 있게 바뀌었다.
이유는 특검법의 공개 조항 때문이라고 했지만, 같은 법을 놓고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말과 “명확하다”는 말이 번갈아 나왔다. 중계•공개 관련 법리 적용 범위를 둘러싼 판결 태도에 일관성이 없자, 국민은 ‘판사가 때로는 공개를 막고 때로는 공개를 강제하는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됐다.
■‘세세한 설명’과 ‘돌연한 태도 변화’의 문제
지 판사의 재판 스타일은 설명이 매우 디테일한 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에게까지 “넥타이는 풀어도 된다”는 친근한 언급을 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세부 설명이 변명으로 들리고, 법 적용에 있어 태도가 뒤집힐 때마다 국민은 ‘법관의 판단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느낀다. 특히 재판 중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언론사는 신청권이 없다”면서도 피고•특검에게 재검토를 제안하고, 나중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라 권유하는 등 발언의 선후와 논리가 뒤엉키는 장면은 신뢰를 더 갉아먹는다.
■법원 독립을 지키려는 우려와 국민의 분노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재판부 교체•특별재판부 설치가 판결에 대한 외부적 압력•간섭으로 비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반대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면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그 공백을 정치적 요구가 메우려 들 가능성도 커진다. 양측의 균형은 섬세하다. 지 판사의 경우, ‘섬세한 설명’이 때로는 ‘책임 회피’로, ‘법리적 심사’가 때로는 ‘외부 판단 예단’으로 해석되는 지점이 문제인 것이다.
■무엇이 해법인가
사법부의 답은 명확해야 한다. 첫째, 재판 진행과 법리 판단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공개•비공개, 중계 여부 등의 민감 사안은 법률 해석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그 기준을 재판 과정에서 반복•확인해야 한다. 셋째, 판사의 발언이 향후 상급심 예단이나 외부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심급별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보호돼야 마땅하다.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기초이다. 지귀연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설명의 풍부함’이 아니라 ‘설명의 일관성’이다.
국민은 역사 앞에서, 특히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사건 앞에서 법원이 확고한 원칙과 일관된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대로 “법관 역시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오늘처럼 절실히 느껴진 적은 드물다.



안기종
위클리코리아 발행인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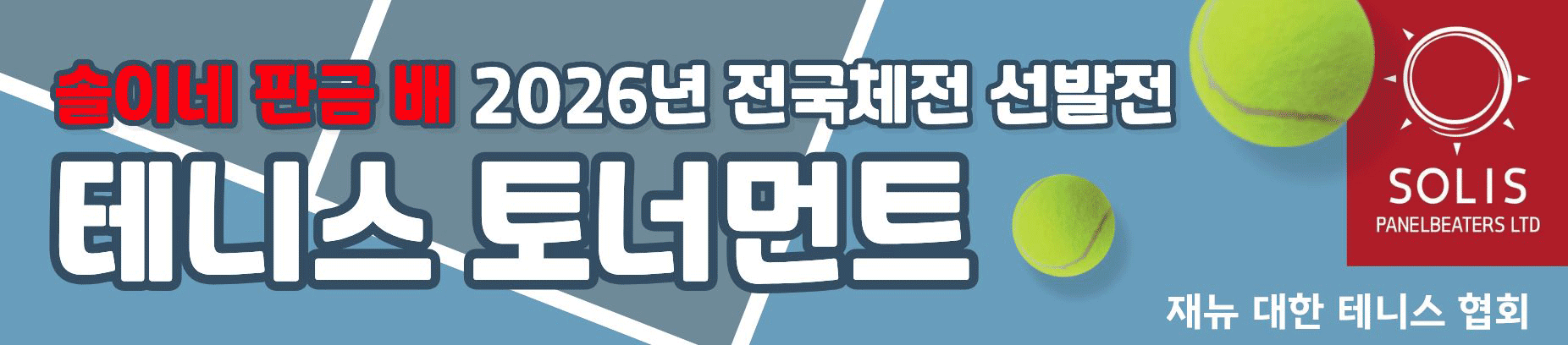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