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회복 열쇠는 ‘현금 보너스’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
- Weekly Korea EDIT
- 2025년 8월 28일
- 2분 분량
뉴질랜드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뉴질랜드의 총인구는 약 530만 명이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9세, 남성은 37.4세로 나타났다.
연간 인구 증가율은 0.7%에 불과했고,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1.57명에 그쳤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로, 2013년 이후 꾸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뉴질랜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할 수 있는 생산연령층(15~64세)이 7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4명으로 줄었고 50년 후에는 불과 2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노동 인구 감소, 세수 축소, 복지 지출 증가라는 ‘3중고’를 의미하며, 재정적·사회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출산 장려금, 효과는 미미”
일각에서는 미국, 한국, 중국 등 다른 나라처럼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은 5천 달러 상당의 ‘베이비 보너스’를 검토한 바 있고, 한국은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며, 중국도 출산 가정에 3600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Infometrics의 수석 인구학자 닉 브룬스던(Nick Brunsdon)은 “현금 보너스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누구도 5천 달러 때문에 아이를 낳을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며, “출산과 양육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브룬스던은 또 “뉴질랜드는 이미 이민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한, 단순히 이민만으로는 인구 구조 악화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거 안정이 출산율 회복의 핵심
Westpac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고든(Michael Gordon)은 저출산의 원인을 ‘삶의 질’ 문제에서 찾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주택 가격 부담과 적절한 주거 공간의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주거 비용이 비싸고 주택 선택지가 제한적이면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자녀 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한 가족 친화적인 주거 단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민 의존 심화와 청년층 유출 문제
뉴질랜드의 또 다른 고민은 청년층의 해외 유출이다. 최근 몇 년간 20~34세 인구에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미래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브룬스던은 “젊은 층이 해외로 떠난다면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사라진다”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는 것 자체가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 단기 보너스보다 장기적 환경 조성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분명하다. 출산 장려금과 같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신, 주거 안정과 일·가정 양립 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다.
다시 말해, 뉴질랜드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주택 정책, 교육·보육 인프라, 노동시장 제도 등 광범위한 영역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임을 시사한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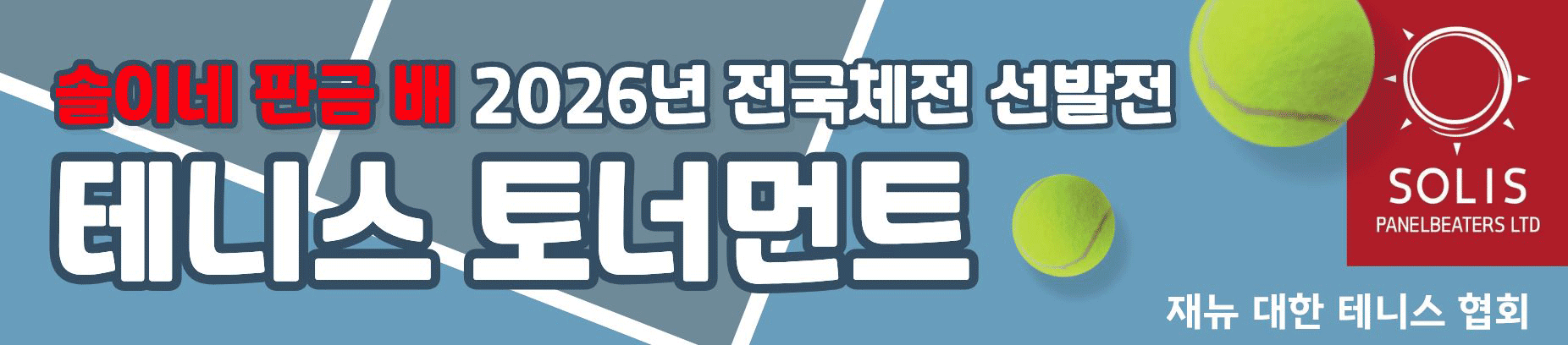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