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발행인 칼럼] 고령사회로 가는 뉴질랜드, 시계를 멈춘 채 걷고 있다
- Weekly Korea EDIT
- 2025년 12월 15일
- 2분 분량

뉴질랜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앞으로 25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전망도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문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예측된 ‘미래’가 아니라, 이미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가적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미흡하다. 고령화가 아니라 정책이 늙고 있다.
헬렌 클라크 재단의 연구자 칼리 메시에가 “우리는 준비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의 정책 속도로는 가까운 2032년까지 약 12,000개의 요양 병상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요양시설 상당수가 자선 운영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여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장기 계획은 미지근하거나 존재조차 모호하다.
문제는 의료 체계 역시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85세 이상 고령층은 40세 대비 16배의 의료비가 든다. 지금도 병원 대기시간은 길고 의료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이 현실에 가까운 미래의 고령층 폭증을 단순히 ‘늘어나는 부담’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주거 문제도 깊어지고 있다. 2001년 82%였던 고령층 주택 보유율은 머지않아 50% 수준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이 치솟는 렌트비를 버티는 구조 자체가 이미 파탄 직전이다. 그럼에도 도시 설계와 주거 정책의 방향성은 여전히 ‘가족형 단독주택’에 갇혀 있다. 걷기 어려운 거리, 부실한 대중교통, 적절한 크기의 주택 공급 부족은 고령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집에서 늙어가기”라는 공식 정책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지역별 불균형도 문제다. 넬슨–타스만의 고령층 증가는 전국 평균의 세 배. 그러나 재정도 인구도 감소하는 지방정부는 손이 묶여 있다. 오클랜드는 앞으로 20만 명 가까운 고령 인구를 추가로 수용해야 하지만, 이미 주거·교통·보건 체계는 과부하 상태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은 부재하다.
불편한 진실은 명확하다. 뉴질랜드의 고령화 위기는 조용히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라, 예고됐음에도 방치된 구조적 실패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단기 공약만 반복하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 왔다. 고령화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끌수록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다. 요양시설 확충, 고령친화형 주거 정책, 의료 인력 확보, 지방정부 지원, 고령층 빈곤 대책 등 국가적 로드맵이 시급하다. 고령화는 이미 시작된 현실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 파장은 경제·사회·도시 구조 전반을 뒤흔들 것이다.
뉴질랜드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 시계가 멈춘 것은 노년층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다. 이제라도 시계를 다시 움직여야 한다.
발행인 안기종

안기종
위클리코리아 발행인


.jpg)
![[안기종 발행인 칼럼] 제2의 내란은 ‘기레기’로부터 시작되는가](https://static.wixstatic.com/media/fdbf97_7bc89009368e49fbbbb4c8605506d668~mv2.jpg/v1/fill/w_487,h_492,al_c,q_80,enc_avif,quality_auto/fdbf97_7bc89009368e49fbbbb4c8605506d668~mv2.jpg)
![[안기종 칼럼] 뉴질랜드는 왜 역주행하는가](https://static.wixstatic.com/media/fdbf97_aafe414ef6a7456584ab8fed766202c1~mv2.png/v1/fill/w_980,h_653,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fdbf97_aafe414ef6a7456584ab8fed766202c1~mv2.png)
![[칼럼] 늦은 은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fdbf97_f316abf37fc64fe595e2834c3a5f0ed2~mv2.png/v1/fill/w_980,h_653,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fdbf97_f316abf37fc64fe595e2834c3a5f0ed2~mv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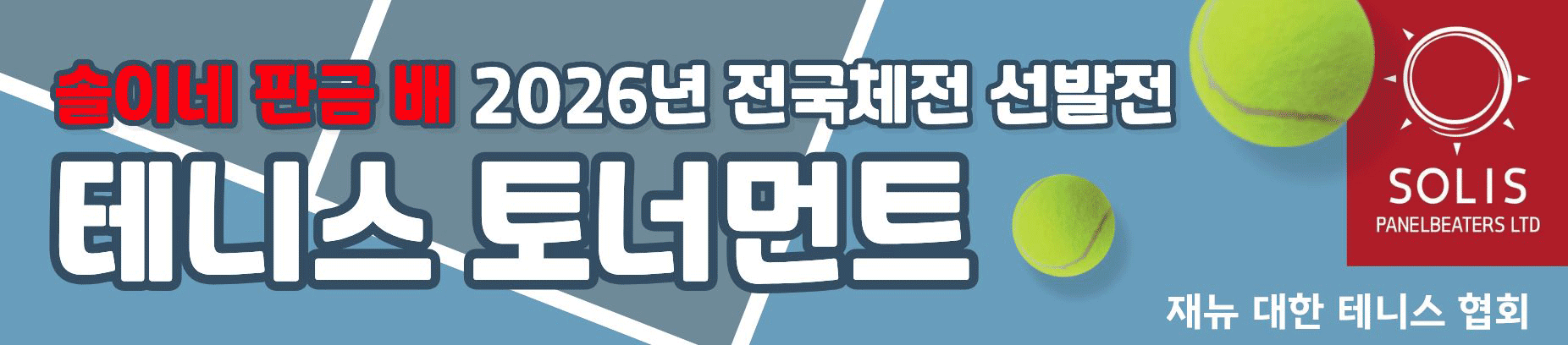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