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나요?”
- Weekly Korea EDIT
- 10월 28일
- 2분 분량

뉴질랜드, 임종기 국민에 대한 ‘연민 점수’ 낮아
세계 최초 ‘Dying Reviews’ 프로젝트, 정부기관·은행 등 공공서비스 공감도 낮아
뉴질랜드가 임종을 앞둔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연민(compassion)’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스피스 뉴질랜드(Hospice NZ)가 실시한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 ‘Dying Reviews(죽음 리뷰)’의 첫 500건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일부 공공서비스의 공감 점수는 평균 2.5점(5점 만점)에 불과했다.
“죽음을 증명해야 하는 행정, 그 자체가 고통”
이 플랫폼은 말기 환자나 그 가족이 병원, 은행, 직장, 정부기관 등 일상 속에서 받은 대우를 평가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전체 평균 점수는 3.28점, 이 중 식당과 행사 관련 서비스(4.55점) 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부기관과 멤버십·구독 서비스(2.5점) 가 가장 낮았다.
가장 큰 불만은 “사망이나 말기 진단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한 응답자는 “나는 불치의 암을 앓고 있는데, 왜 2년마다 내가 여전히 죽어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나요?” 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했느냐’”
호스피스 NZ 대표 웨인 네일러(Wayne Naylor)는 “문제는 행정 절차나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다.”라며, “많은 기관의 시스템이 여전히 ‘정상 업무(business-as-usual)’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민을 시스템 안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이 핵심”이라며, “죽음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죽음 리뷰’를 만든 사람들 — 사랑과 상실에서 시작된 변화
이 프로젝트는 고(故) 남편의 투병을 겪은 데브 맥컬럭(Deb McCulloch)의 경험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남편 스티브가 암으로 투병하던 시절,

“작은 카페 하나가 우리의 안식처였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남편의 죽음 후, 맥컬럭은 ‘Dying Matters’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데스 둘라(Death Doula)’, 즉 임종기 동반자로 활동하며 다른 이들의 마지막을 지원하고 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
‘Dying Reviews’에 참여한 380명의 응답자 중 상당수는 “매번 새로운 양식, 새로운 담당자를 마주할 때마다 같은 사연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버렸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하지만, 따뜻한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이름을 기억한 약사, 병문안을 온 은행 지점장, 단지 ‘다른 손님과 똑같이’ 대해준 카페 직원. 이런 작은 인간적인 순간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 희망의 빛”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죽음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의 한 과정”
호스피스 NZ는 이미 주요 은행과 일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대상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교육은 말기 환자나 가족을 대할 때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웨인 네일러 대표는 말한다.
“연민을 행정 절차 속에 다시 불러오는 순간, 사람들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을 말해준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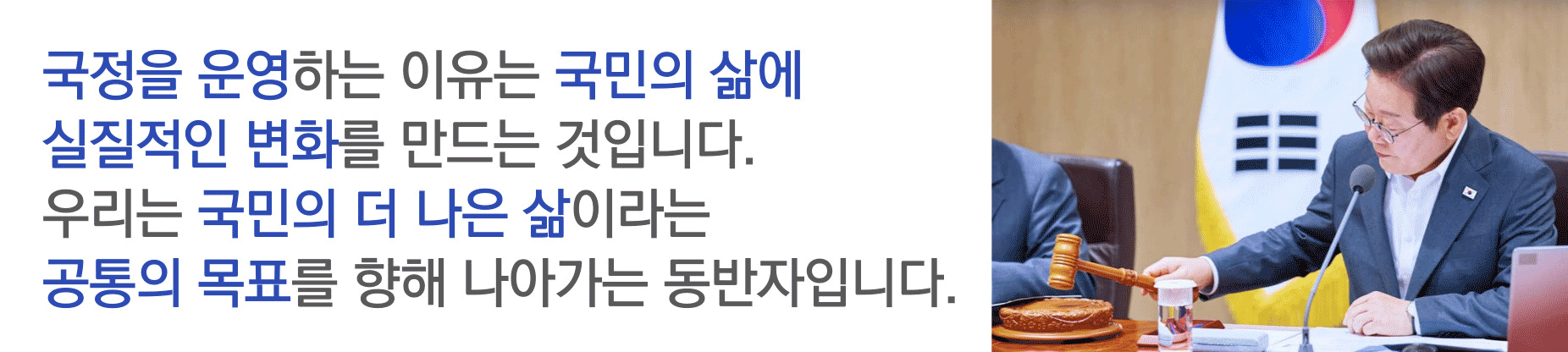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