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생활비에 소득으론 따라잡기 힘겨워
- Weekly Korea EDIT
- 9월 15일
- 2분 분량

국민들이 생활비 상승 속도를 소득으로 따라잡지 못하며 점점 더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전기·보험료·식비와 같은 기본 지출은 매년 오르고 있지만, 가계 소득 증가폭은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두 아이의 어머니 헬렌 길비는 최근 1년 사이 전기요금이 약 10% 오르고 보험료는 평균 20% 인상돼 가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식비 예산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식료품밖에 살 수 없고, 결국 퇴직연금인 KiwiSaver 불입을 잠시 멈출까 고민할 정도”라며 “현재를 버티기 위해 미래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특히 정부 지원의 소득 공제율(abatement rate) 때문에 임금 인상이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겪고 있다. 길비는 “단순 계산으로 연봉이 10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오르더라도 세금과 지원 삭감을 고려하면 주급이 고작 200달러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분석기관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이 가장 큰 압박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고소득층도 이자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생활비 상승보다 9% 높았지만, 2023년에는 생활비 증가가 소득보다 3.5% 더 높아졌다. 반면 고소득층은 이자 비용 부담이 크면서 같은 시기 1.8%의 소득·지출 격차를 기록했다.

가레스 키어넌 인포메트릭스 수석 예측가는 “최근에는 모든 분야의 물가가 오르며 피하기 힘든 지출 압박이 이어졌다”며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전기료와 식비 같은 필수 비용이 다시 오르고 있어 올해도 실질 소득이 뒷걸음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재정 상담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스쇼어 예산지원센터의 데이비드 베리 멘토는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월세가 세후 소득의 50~70%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고금리 부채는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멘토 슐라 뉴랜드는 “최근 400달러가 넘는 전기요금을 받아든 가구가 적지 않았다”며 “저소득층은 필수 식비와 생활비를 줄이는 반면, 고소득층은 외식·여가비를 줄이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웰링턴의 한 가정은 남편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계 예산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외식과 청소 서비스 같은 선택 지출을 모두 줄이고, 전기차 충전 시간까지 아껴가며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내 제스는 “생활비가 줄줄 새듯 빠져나가고 있어 신발조차 접착제로 붙여 신을 정도”라며 “언제 다시 안정적인 소득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 NZ의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67%가 생활비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으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전기료와 식비는 특히 국민들의 주요 고민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까지도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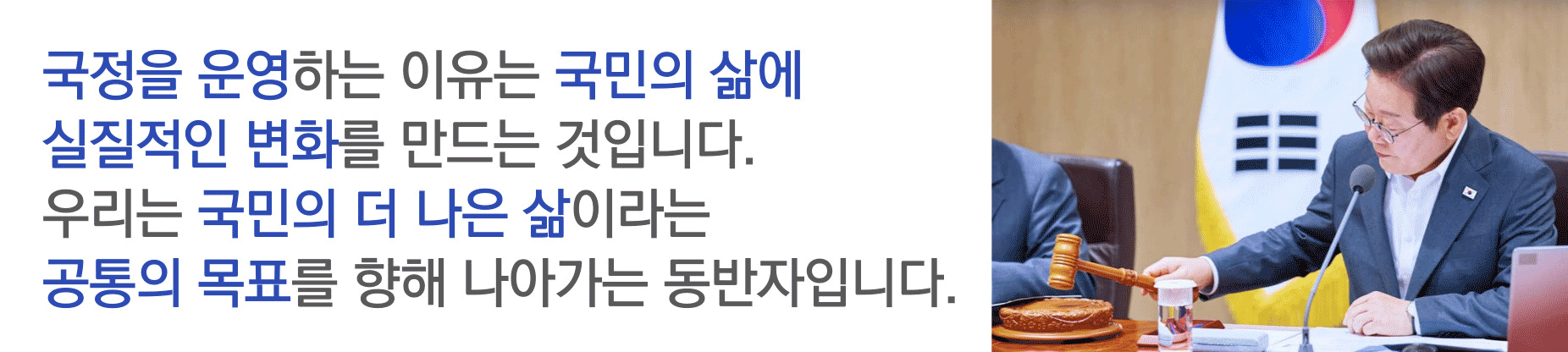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