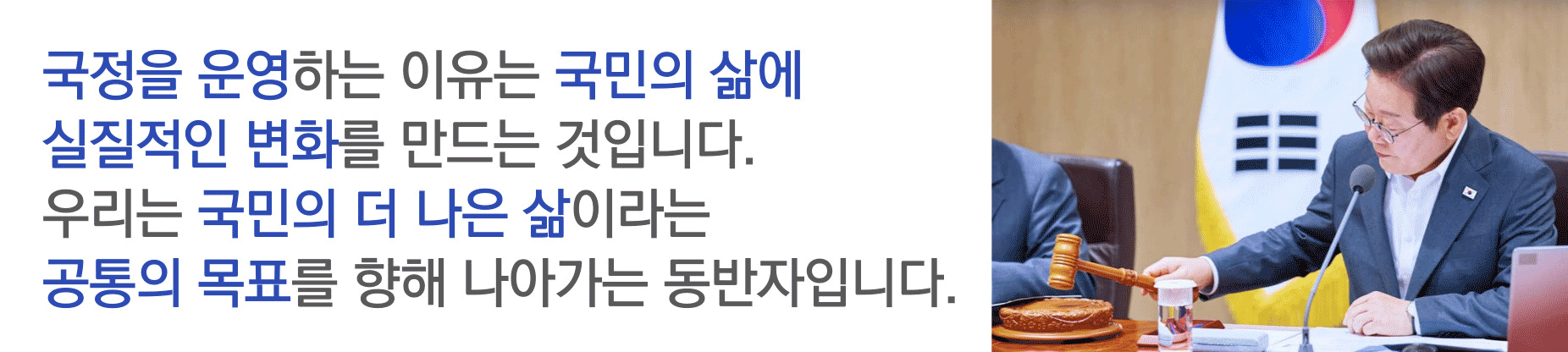“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는 키위들
- WeeklyKorea
- 13시간 전
- 2분 분량
호주행 선택하는 뉴질랜드 사람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25년,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오랜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은 달랐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태즈먼 해협을 건너고 있다. 웰링턴 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는 숫자보다 분명한 이유를 보여준다.

전직 경찰관 셰인 암너는 일자리를 확정하지 않은 채 호주행 비행기에 오른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실직한 적이 없었던 그는 “솔직히 긴장된다”고 말한다. 퍼스 인근 금광에서 일할 가능성을 보고 떠나는 선택이다.
호주에서 일하는 가족을 통해 들은 연봉은 13만 달러. 뉴질랜드에서 경찰로 6년을 일했지만 한 번도 연봉 10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는 정착 후 가족을 불러 최소 5년 이상 머물 계획이다.

응급실 간호사 캐롤라인 웹 역시 호주로 향한다. 1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는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 반면 태즈메이니아에서는 일자리를 바로 얻었다. 환자 수가 제한된 근무 환경, 점심시간이 보장되는 조건은 그녀에게 큰 차이로 다가왔다.
은퇴 연령대의 이동도 눈에 띈다. 이반과 브론윈 브라티나는 와이라라파에서의 3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골드코스트로 돌아간다. 다섯 명의 손주가 모두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날씨도 더 좋다”며 웃지만, 가족이 가장 큰 이유다.
젊은 전문직의 선택도 이어진다. 마케팅 매니저 사치는 웰링턴 방문을 마치고 멜버른으로 돌아간다. 런던 생활 이후 귀국을 고민했지만, 일자리와 문화적 활력이 살아 있는 도시는 멜버른이었다. 그녀는 “웰링턴은 멋진 도시지만 문 닫는 가게가 늘고, 할 일이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통계는 이 같은 체감을 뒷받침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이동한 순유출 인구는 3만 명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출생자는 약 60만 명에 이르며, 이미 형성된 가족·지인 네트워크가 이동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돼 왔다. 2008년 존 키 전 총리는 2025년까지 호주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조적 개혁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뉴질랜드’ 현상은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고, 집권 후에는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겉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구매력 기준으로 호주 소득은 여전히 뉴질랜드보다 약 24%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뉴질랜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임금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택, 이민, 교육, 보건, 산업 구조, 기후 대응까지 아우르는 접근 없이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빠른 해결책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웰링턴 공항 출국장에 선 사람들의 선택은 분명하다. 더 나은 소득, 더 안정된 일자리, 가족과의 가까운 삶. 뉴질랜드가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jpg)